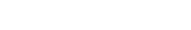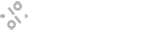박성준 교수팀, 항면역성 뇌-기계 인터페이스 구현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서울대 첨단융합학부 및 의과대학 소속 박성준 교수 및 연구팀(남금석 박사과정, 성창훈 박사후 연구원)이 전극, 광섬유, 미세유채채널을 모두 통합한 올 하이드로겔 기반 다기능성 신경섬유를 개발해, 염증을 줄이고 생체조직과의 일체감을 높인 차세대 뇌-기계 인터페이스 구현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삽입형 신경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체조직과 전자소자 간의 경계를 줄이고자 하는 접근에서 시작됐다. 체내 삽입형 신경 인터페이스는 뇌와 기계를 직접 연결해 신경 신호를 정밀하게 기록하고 자극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금속 또는 고분자 소재 기반의 장치는 생체조직과의 기계적, 화학적 불일치로 인해 삽입 직후부터 염증과 섬유화가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신호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조직과 유사한 물성을 가진 하이드로겔 소재에 주목했다. 하이드로겔은 뇌조직과 유사한 탄성률을 지니고, 분자 투과성과 생화학적 변형이 가능해 신경세포와의 친화적 접촉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이다. 그러나 하이드로젤을 이용할 경우 다중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통합하기에는 제조상의 제약이 컸기에, 기존에는 전기적, 광학적, 화학적 기능 중 한 가지만 수행하는 단일 기능 장치의 개발에 연구가 머물러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열 인발 공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 전극, 광도파로, 약물전달 채널을 모두 하이드로겔로 제작하고, 이와 동시에 서로 다른 기능성 하이드로겔을 미세 정밀도로 집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새롭게 개발된 다기능성 신경섬유는 전도성 하이드로겔, 투명한 광섬유 하이드로겔, 약물 방출용 미세유체 하이드로겔로 구성돼 있다. 이 구조는 조직과 유사한 연성과 생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삽입 시 조직 손상과 염증 반응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연구팀은 해당 디바이스가 단일 플랫폼에서 신경 신호 기록, 광 자극, 약물 전달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뇌 기능의 정밀 제어가 가능함도 동물 실험을 통해 보였다.
박성준 교수는"이번 연구는 하이드로겔만을 이용한 신경탐침을 개발한 최초의 사례로, 생체적합성과 다기능성을 동시에 실현해 신경염증과 조직 손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이번 연구를 통해 만든'스텔스 디바이스'가, 뇌-기계 인터페이스 및 뇌신경조절 치료 분야 등에서 차세대 신경공학 기술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Advanced Materials' 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모든 구성 요소가 하이드로겔로 이뤄진 다기능성 신경섬유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생체조직과의 기계적/화학적 일체감을 확보하고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열 인발 공정을 통해 전극, 광섬유, 약물전달 미세유체채널을 각각 도전성/투명성/투과성을 지닌 하이드로겔로 정밀 집적함으로써, 기존 금속 기반 장치의 기계적 불일치와 생체 부적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이 올 하이드로겔 섬유는 뇌조직과 유사한 연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신경 손상과 면역 반응을 현저히 줄였으며, 전기적/광학적/화학적 기능을 단일 플랫폼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신경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직과 전자소자 간의 경계를 줄여 면역 반응을 완화하는, 생체조직과 기계적·화학적으로 유사한 올 하이드로겔 섬유 기반 신경 인터페이스의 개념도 /사진=서울대 제공
Copyright© 베리타스알파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출처: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539
이번 연구는 기존 삽입형 신경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체조직과 전자소자 간의 경계를 줄이고자 하는 접근에서 시작됐다. 체내 삽입형 신경 인터페이스는 뇌와 기계를 직접 연결해 신경 신호를 정밀하게 기록하고 자극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다. 그러나 금속 또는 고분자 소재 기반의 장치는 생체조직과의 기계적, 화학적 불일치로 인해 삽입 직후부터 염증과 섬유화가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신호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조직과 유사한 물성을 가진 하이드로겔 소재에 주목했다. 하이드로겔은 뇌조직과 유사한 탄성률을 지니고, 분자 투과성과 생화학적 변형이 가능해 신경세포와의 친화적 접촉을 구현할 수 있는 소재이다. 그러나 하이드로젤을 이용할 경우 다중 기능을 하나의 장치에 통합하기에는 제조상의 제약이 컸기에, 기존에는 전기적, 광학적, 화학적 기능 중 한 가지만 수행하는 단일 기능 장치의 개발에 연구가 머물러 있던 실정이었다. 이에 연구팀은 열 인발 공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이용, 전극, 광도파로, 약물전달 채널을 모두 하이드로겔로 제작하고, 이와 동시에 서로 다른 기능성 하이드로겔을 미세 정밀도로 집적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새롭게 개발된 다기능성 신경섬유는 전도성 하이드로겔, 투명한 광섬유 하이드로겔, 약물 방출용 미세유체 하이드로겔로 구성돼 있다. 이 구조는 조직과 유사한 연성과 생화학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삽입 시 조직 손상과 염증 반응을 크게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연구팀은 해당 디바이스가 단일 플랫폼에서 신경 신호 기록, 광 자극, 약물 전달을 모두 수행할 수 있어 뇌 기능의 정밀 제어가 가능함도 동물 실험을 통해 보였다.
박성준 교수는"이번 연구는 하이드로겔만을 이용한 신경탐침을 개발한 최초의 사례로, 생체적합성과 다기능성을 동시에 실현해 신경염증과 조직 손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이번 연구를 통해 만든'스텔스 디바이스'가, 뇌-기계 인터페이스 및 뇌신경조절 치료 분야 등에서 차세대 신경공학 기술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성과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학술지 'Advanced Materials' 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모든 구성 요소가 하이드로겔로 이뤄진 다기능성 신경섬유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생체조직과의 기계적/화학적 일체감을 확보하고 염증 반응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열 인발 공정을 통해 전극, 광섬유, 약물전달 미세유체채널을 각각 도전성/투명성/투과성을 지닌 하이드로겔로 정밀 집적함으로써, 기존 금속 기반 장치의 기계적 불일치와 생체 부적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이 올 하이드로겔 섬유는 뇌조직과 유사한 연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신경 손상과 면역 반응을 현저히 줄였으며, 전기적/광학적/화학적 기능을 단일 플랫폼에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차세대 신경 인터페이스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조직과 전자소자 간의 경계를 줄여 면역 반응을 완화하는, 생체조직과 기계적·화학적으로 유사한 올 하이드로겔 섬유 기반 신경 인터페이스의 개념도 /사진=서울대 제공
Copyright© 베리타스알파무단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출처: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578539